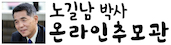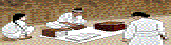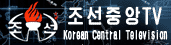서거 10주기 통일지기 "문익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4-01-21 00:00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난 올해 안에 평양으로 갈 거야/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이건 진담이라고’(문익환의 시 ‘잠꼬대가 아닌 잠꼬대’ 중)
1989년 1월1일 새해 첫새벽에 늦봄 문익환 목사는 이렇게 썼다. 그해 3월 ‘진담으로’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분단시대 통일꾼’의 영원한 상징이 됐다.
1918년 6월1일 만주 북간도 화룡면 명동촌에서 태어나 1994년 1월18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타계한 늦봄은 76년 세월동안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시인이자 운동가였다. 그리고 그 뿌리는 민족주의였다. 망국의 설움을 안고 국경을 넘어 북간도 땅을 휘저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그 자양분이었다.

그는 1932년 평양 숭실중학교 5학년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용정 광명중학교를 다닌다. 1938년 도쿄에 있는 일본신학교로 갔다가 1943년 일제가 학도병을 강요하자, ‘일본을 위해 피를 흘릴 생각은 없다’고 만주의 봉천신학도로 옮긴다. 만주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해방을 맞은 그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신의주와 사리원, 개성을 거쳐 1946년 6월 서울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1958년 미국 프린스턴신학대 졸업을 거쳐 76년 대한성서공회의 성서번역위원장 일을 마칠 때까지, 늦봄의 인생은 바른 길을 가려는 한사람의 목회자였다. 지동식, 전택부, 장준하 등과 함께 만든 복음동지회에서 그가 시작한 사업은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한국인의 손으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늦봄은 한신대 교수직까지 사임하고 성서 번역에 전념했다. 그 성경이 지금 가톨릭교회에서 사용중인 <공동번역성서>다.
그를 시인으로 이끈 것은 성경이었다. 8년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약의 4할을 차지하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 시를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하다 시인이 됐다.
그런 그를 운동가로 만든 것은 바로 암울한 시대였다. 1975년 8월17일, 절친했던 친구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가 직접 계기였다. 그는 장준하 선생을 ‘되살아난 백범’이라고 불렀다. 늦봄은 “그의 주검을 땅속에 내리면서 내가 백범·장준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76년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시작해 그는 다섯번 옥살이를 한다.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78년 처음 구속된 뒤, 내란예비음모사건(80년)과 서울대 강연 내용때문에(85년),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평양길을 갔다(89년)는 것이 마지막 구속사유였다.
그가 통일꾼을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늦봄은 1994년 3월1일 통일운동조직 ‘통일맞이’를 결성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밤낮없이 뛰던 중 세상을 떴다. 그의 어머니 김신묵 여사는 그보다 4년 앞서 1990년 9월 운명하기 직전 문병 온 박형규 목사의 ‘통일보고 가셔야죠’라는 말에 ‘통일은 다 됐어’라는 화답을 남겼다. 늦봄이 1993년 12월12일 마지막으로 쓴 시는 이렇게 끝난다. “이땅의 아리따운 봄 향내, 당신의 애기를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봄이 이제 다시 오고 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출처:인터넷한겨레 04/01/16]
1989년 1월1일 새해 첫새벽에 늦봄 문익환 목사는 이렇게 썼다. 그해 3월 ‘진담으로’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분단시대 통일꾼’의 영원한 상징이 됐다.
1918년 6월1일 만주 북간도 화룡면 명동촌에서 태어나 1994년 1월18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타계한 늦봄은 76년 세월동안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시인이자 운동가였다. 그리고 그 뿌리는 민족주의였다. 망국의 설움을 안고 국경을 넘어 북간도 땅을 휘저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그 자양분이었다.

그는 1932년 평양 숭실중학교 5학년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용정 광명중학교를 다닌다. 1938년 도쿄에 있는 일본신학교로 갔다가 1943년 일제가 학도병을 강요하자, ‘일본을 위해 피를 흘릴 생각은 없다’고 만주의 봉천신학도로 옮긴다. 만주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해방을 맞은 그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신의주와 사리원, 개성을 거쳐 1946년 6월 서울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1958년 미국 프린스턴신학대 졸업을 거쳐 76년 대한성서공회의 성서번역위원장 일을 마칠 때까지, 늦봄의 인생은 바른 길을 가려는 한사람의 목회자였다. 지동식, 전택부, 장준하 등과 함께 만든 복음동지회에서 그가 시작한 사업은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한국인의 손으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늦봄은 한신대 교수직까지 사임하고 성서 번역에 전념했다. 그 성경이 지금 가톨릭교회에서 사용중인 <공동번역성서>다.
그를 시인으로 이끈 것은 성경이었다. 8년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약의 4할을 차지하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 시를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하다 시인이 됐다.
그런 그를 운동가로 만든 것은 바로 암울한 시대였다. 1975년 8월17일, 절친했던 친구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가 직접 계기였다. 그는 장준하 선생을 ‘되살아난 백범’이라고 불렀다. 늦봄은 “그의 주검을 땅속에 내리면서 내가 백범·장준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76년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시작해 그는 다섯번 옥살이를 한다.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78년 처음 구속된 뒤, 내란예비음모사건(80년)과 서울대 강연 내용때문에(85년),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평양길을 갔다(89년)는 것이 마지막 구속사유였다.
그가 통일꾼을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늦봄은 1994년 3월1일 통일운동조직 ‘통일맞이’를 결성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밤낮없이 뛰던 중 세상을 떴다. 그의 어머니 김신묵 여사는 그보다 4년 앞서 1990년 9월 운명하기 직전 문병 온 박형규 목사의 ‘통일보고 가셔야죠’라는 말에 ‘통일은 다 됐어’라는 화답을 남겼다. 늦봄이 1993년 12월12일 마지막으로 쓴 시는 이렇게 끝난다. “이땅의 아리따운 봄 향내, 당신의 애기를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봄이 이제 다시 오고 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출처:인터넷한겨레 04/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