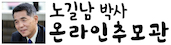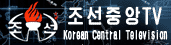이 병 걸리면 가정이 다 무너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5-05-31 01:23 조회1,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여의도 성모병원 13층. 항암치료 병동인 이곳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있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이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헤어캡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최소한 일년이상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백혈병의 경우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다.
종일 환자 옆에 붙어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보호자들을 만나 보았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짧은 시간동안 식사를 마치고 다시 환자곁으로 가봐야 한다며 대화를 거절했다. 힘겹게 대화를 시작한 보호자들도 병원비와 생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이 병 걸렸다 하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풍비박산나요.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부모가 다 매달리니까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김씨는 대학생이던 아들이 작년 11월 림프구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7개월째 병원생활중이다. 지금까지 병원비중 적게 나온 달은 1천만원, 많게는 2천 5백만원까지도 지출했다는 김씨.
"뭘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처음엔 동생이나 처갓집에 손벌리고, 안되면 친구한테 구하고 그런거죠.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안되면 결국은 도둑질이라도 해야죠."
옆에 있던 병원노조 간부가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유인물을 건네며 설명하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누군데 이런 걸 만들겠어요. 대통령이 암에 걸려보지 않은 이상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물정 모른다며 타박을 하면서도 김씨는 암이 무상치료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행했던 노조 조합원 안진아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백혈병 환자 대부분이 치료비로 1,2억은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간 성공적이어서 한 달에 천만원이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지난 12월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병원생활을 시작한 박씨는 그래도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 달에 천만원이 적게 들어간 정도라면 보통은 어느 정도일까?
항암치료 과정이 길어져서 항암제량이 증가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항생제의 양을 늘리거나 혈액보충이 많아지게 되면 보통 3천~4천만원 정도를 월 치료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70대였는데 있는 집 날리고 월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천만원 남았대요. 그거 끝나면 치료를 더 할 수 있을 지도 장담못하는거죠."
박씨는 그간 들어놓았던 암보험의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긴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긴 어렵다.
"나이 많고 집 한 채 있다고 의료보험료는 남들보다 비싸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는 보험혜택도 못받아요. 일일이 민간보험 들어서 혜택볼거라면 도대체 의료보험은 왜 있는거예요? 냈으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하는 박씨의 경우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암환자의 상태는 언제 악화될 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저축해놓은 돈이랑 집이 있으니까 버틴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모르죠. 병이 다 낫는다고 해도 직장도 없고 집도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이먹고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렸으니 막막하죠."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이는 박씨. 그래도 반신반의한다.
"우리한테야 좋은 소리지만 안 겪어본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통계에 따르면 실제 성인 남성 세 명중 한 명이 암에 걸렸거나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암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암은 한 집안을 풍비박살내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일년이상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백혈병의 경우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다.
종일 환자 옆에 붙어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보호자들을 만나 보았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짧은 시간동안 식사를 마치고 다시 환자곁으로 가봐야 한다며 대화를 거절했다. 힘겹게 대화를 시작한 보호자들도 병원비와 생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이 병 걸렸다 하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풍비박산나요.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부모가 다 매달리니까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김씨는 대학생이던 아들이 작년 11월 림프구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7개월째 병원생활중이다. 지금까지 병원비중 적게 나온 달은 1천만원, 많게는 2천 5백만원까지도 지출했다는 김씨.
"뭘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처음엔 동생이나 처갓집에 손벌리고, 안되면 친구한테 구하고 그런거죠.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안되면 결국은 도둑질이라도 해야죠."
옆에 있던 병원노조 간부가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유인물을 건네며 설명하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누군데 이런 걸 만들겠어요. 대통령이 암에 걸려보지 않은 이상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물정 모른다며 타박을 하면서도 김씨는 암이 무상치료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행했던 노조 조합원 안진아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백혈병 환자 대부분이 치료비로 1,2억은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간 성공적이어서 한 달에 천만원이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지난 12월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병원생활을 시작한 박씨는 그래도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 달에 천만원이 적게 들어간 정도라면 보통은 어느 정도일까?
항암치료 과정이 길어져서 항암제량이 증가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항생제의 양을 늘리거나 혈액보충이 많아지게 되면 보통 3천~4천만원 정도를 월 치료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70대였는데 있는 집 날리고 월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천만원 남았대요. 그거 끝나면 치료를 더 할 수 있을 지도 장담못하는거죠."
박씨는 그간 들어놓았던 암보험의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긴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긴 어렵다.
"나이 많고 집 한 채 있다고 의료보험료는 남들보다 비싸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는 보험혜택도 못받아요. 일일이 민간보험 들어서 혜택볼거라면 도대체 의료보험은 왜 있는거예요? 냈으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하는 박씨의 경우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암환자의 상태는 언제 악화될 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저축해놓은 돈이랑 집이 있으니까 버틴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모르죠. 병이 다 낫는다고 해도 직장도 없고 집도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이먹고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렸으니 막막하죠."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이는 박씨. 그래도 반신반의한다.
"우리한테야 좋은 소리지만 안 겪어본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통계에 따르면 실제 성인 남성 세 명중 한 명이 암에 걸렸거나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암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암은 한 집안을 풍비박살내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