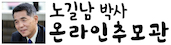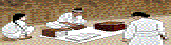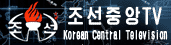전태일열사 동생 순옥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5-12 00:00 조회1,8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태일열사 동생 순옥씨 노동문제 박사돼 귀국
△ 최근 영국에서 노동문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전순옥(46)씨가 8일 자택에서 학위 논문을 앞에 놓고 큰 오빠인 고 전태일 열사를 회고하고 있다.
31년 걸려 되살린 절규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자신을 불태워 7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여명을 밝힌 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 영국유학 11년만에 노동문제 박사가 되어 돌아왔다.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왜 하필 70년대인가 하는 고민이 엄습할 때마다 <전태일평전>을 꺼내 읽으며 스스로를 격려했지요.”
유학11년…힘들때마다 "전태일평전" 읽어
지난 3월 노동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영국 런던 워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귀국한 전순옥(46)씨의 학위 논문 제목은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와 민주노조 운동을 다룬 이 논문은 “우리가 심사한 최고의 논문”이라는 심사위원들의 격찬 속에 이번 학기 워릭대학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또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지에서 동시 출판이 추진되고 있고, 순옥씨 자신은 카디프대학 사회과학부 초빙교수가 됐다.
큰 오빠 고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외쳤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피맺힌 절규가 31년 만에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논문으로 되살아나 세계 노동계에 메아리치게 된 셈이다.
오빠의 분신은 순옥씨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970년 당시 16살 소녀였던 그는 이듬해부터 어머니 이소선씨와 함께 오빠의 뒤를 이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80년대말 일본과 독일 노동자들을 만나 국경을 넘는 노동 연대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나 `영어"의 장벽에 부딪혔다.
“35살 늦은 나이였지만, 국제 노동연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영어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6개월 예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없는 영국으로 무작정 어학연수를 떠난게 11년이나 됐네요.”
70년대 노동운동 다뤄 "최우수논문상"
세계 최초로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당이 설립된 나라지만 대처 정부 이후 황폐해진 영국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면서, 박정희 유신독재를 `한강의 기적"으로 미화시킨 서양 논문들을 읽으면서, `아시아 여성들은 아무리 억압을 받아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편견에 부딪히면서, 그는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비인간적인 착취와 학대에 짓눌렸던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을 역사 속에 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한다.
"여성노동자 보듬기 혼신 다할것"
그의 논문은 통계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았다. 동일방직노조, 청계피복노조 등 70년대 여성노동 운동의 주역 100여명을 7개월 동안 직접 만나 토론하며 들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순옥씨는 앞으로 노조도 못 만든채 항상적인 해고위협에 놓여 있는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그 실태를 세상에 알릴 계획이다. 또 영국 학자들과 함께 7개국 노동현장을 비교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영국 노조도 5년쯤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한 그는 “한국의 노조도 비정규직으로 떠밀리고 있는 여성등 약자들과 함께 해야만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 최근 영국에서 노동문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전순옥(46)씨가 8일 자택에서 학위 논문을 앞에 놓고 큰 오빠인 고 전태일 열사를 회고하고 있다.
31년 걸려 되살린 절규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자신을 불태워 7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여명을 밝힌 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 영국유학 11년만에 노동문제 박사가 되어 돌아왔다.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왜 하필 70년대인가 하는 고민이 엄습할 때마다 <전태일평전>을 꺼내 읽으며 스스로를 격려했지요.”
유학11년…힘들때마다 "전태일평전" 읽어

지난 3월 노동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영국 런던 워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귀국한 전순옥(46)씨의 학위 논문 제목은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와 민주노조 운동을 다룬 이 논문은 “우리가 심사한 최고의 논문”이라는 심사위원들의 격찬 속에 이번 학기 워릭대학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또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지에서 동시 출판이 추진되고 있고, 순옥씨 자신은 카디프대학 사회과학부 초빙교수가 됐다.
큰 오빠 고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외쳤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피맺힌 절규가 31년 만에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논문으로 되살아나 세계 노동계에 메아리치게 된 셈이다.
오빠의 분신은 순옥씨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970년 당시 16살 소녀였던 그는 이듬해부터 어머니 이소선씨와 함께 오빠의 뒤를 이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80년대말 일본과 독일 노동자들을 만나 국경을 넘는 노동 연대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나 `영어"의 장벽에 부딪혔다.
“35살 늦은 나이였지만, 국제 노동연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영어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6개월 예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없는 영국으로 무작정 어학연수를 떠난게 11년이나 됐네요.”
70년대 노동운동 다뤄 "최우수논문상"
세계 최초로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당이 설립된 나라지만 대처 정부 이후 황폐해진 영국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면서, 박정희 유신독재를 `한강의 기적"으로 미화시킨 서양 논문들을 읽으면서, `아시아 여성들은 아무리 억압을 받아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편견에 부딪히면서, 그는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비인간적인 착취와 학대에 짓눌렸던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을 역사 속에 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한다.
"여성노동자 보듬기 혼신 다할것"
그의 논문은 통계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았다. 동일방직노조, 청계피복노조 등 70년대 여성노동 운동의 주역 100여명을 7개월 동안 직접 만나 토론하며 들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순옥씨는 앞으로 노조도 못 만든채 항상적인 해고위협에 놓여 있는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그 실태를 세상에 알릴 계획이다. 또 영국 학자들과 함께 7개국 노동현장을 비교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영국 노조도 5년쯤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한 그는 “한국의 노조도 비정규직으로 떠밀리고 있는 여성등 약자들과 함께 해야만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