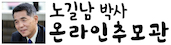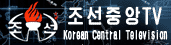한겨레 홍세화 기자의 대학시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3-16 00:00 조회1,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시지프스의 바위"를 닮은 백수
[나의 대학시절 ⑨] 한겨레 기자된 홍세화씨
홍세화 기자
11년 6개월이라는 긴 나의 대학 시절에 "낭만적 실존", 아니 그 앞에 "어설픈"이라는 말을 붙이면 딱 맞겠다. 그래 "어설픈 낭만적 실존".
하여튼 백수, 그런 백수도 없었다. 무계획에, 무책임에. 제대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비유컨대 나의 삶은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였다. 다시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 그 바위를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비극은 처절했지만, 저항이고, 철저한 삶이었듯. 바위로 강을 메우고, 흘러 내려가고, 또 가라 앉더라도 갖다 메우고 또 갖다 메우는 그런 과정.
비유컨대 나의 삶은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였다. 다시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 그 바위를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비극은 처절했지만, 저항이고, 철저한 삶이었듯. 바위로 강을 메우고, 흘러 내려가고, 또 가라 앉더라도 갖다 메우고 또 갖다 메우는 그런 과정.
처음 대학생이라는 꼬리를 단 것은 서울대 공대 금속 공학과 66학번 때였다. 당시로는 최대의 KS마크를 획득한 셈이다. 하지만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영어보다 수학을 잘 해 이과를 선택했을 뿐이니 당최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결석이 잦았고, 결과는 낙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한 치의 변함없는 대학 생활의 방황 끝에 학교를 아예 그만 두고, 다시 정식으로 시험을 쳐 서울대 외교학과 69학번으로 명함을 갈아 치웠다.
외교학과로의 전환은 한반도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궁금해 선택했지만 그마저도 나와 대학을 묶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닥치는대로 책을 파고 들었다. 리영희 선생의 <전환 시대의 논리>는 물론, <공산당 선언>, 보들레르의 <악의 꽃>, 베를레느와 랭보의 작품들도 두루두루 나의 손을 거쳐 갔다.
이렇게 대학에 대한 회의는 쌓여만 갔고, 잠재울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의 발길은 동숭동 문리대 건너편 학림 다방으로 닿았다. 이 곳은 문리대 낭만파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였다. 언제나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차를 마시지 않고도 앉자 있을 수 있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안겨 줬기 때문일까.
그러면서 자연스레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고,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등 부숴대는 음악들을 들어댔다.
또 이때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이걸 연애라고 믿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연애인가 싶기도 하다. 3개월에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만나서는 사귀고, 딱히 할 일 없으면 빵집에서 죽치기 일쑤였다.
또 나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담배"였다. 대학을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담배 피는 거였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알만 하지 않나. 도통 술은 못하면서, 담배는 하루에 세 갑을 피워, "염소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따라 다녔다.
이렇게 조용조용한 나의 삶과는 달리 학내에서는 1학년 때부터 소리 없는 저항이 여기저기서 숨쉬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이니, 교련 반대 투쟁이니 이래저래 대학생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일들이 숱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투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행여나 발언을 하는 일이 있어 대중 앞에 쉽사리 나서면 얼굴부터 발갛게 달아오르는 나이기에 부러울 뿐이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자 문리대 연극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나를 유인한 것은 연극반 회장을 맡고 있던 임진택이었지만, 유난히 수줍음 많고 소심한 성격 탓에 망설이는 나에게 지하형의 등장은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 줬다. 당시 연극을 통해 통해 바라본 그는 등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 연극은 제대로 무대에 올려진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 풍자하는 연극인지라 학교에서 쉽게 허가 해 줄 리 만무했다.
한편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던 터라 반군사 파쇼독재 학생 운동은 계속됐다. 나는 연극에 여념이 없었고, 내 습작으로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더불어 대학가 지하 신문도 제작하고 종종 투쟁에 선동가가 아닌 학생 대중의 일원으로 참여하곤 했다. 이러한 투쟁 분위기는 무르익어, 급기야 임시 휴교령까지 내려졌고, 일체 서클 활동과 집회도 금지 당했다.
그러다 나도 이와 관련해 선언문을 작성, 낭독했다는 이유로 중앙 정보부에 끌려갔고 이때의 기억은 여전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물론 그닥 문제 될 것이 없어 풀려났지만, 학교에서는 제적을 당했고, 이듬해 학교측에서는 한시적으로 제적 당한 학생들을 구해 줘, 행인지 불인지 다시 학교로 돌아 올 수 있게 됐다.
이후 나는 입대를 해야했고, 입대 일주일을 앞두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나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군대 시절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모를 당해야 했으니.
 76년, 드디어 제대를 했지만 나에게는 아내와 딸 수현이, 아들 용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땅히 삶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나인지라 돈벌이를 위해서는 우선 졸업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졸업 한 학기를 남겨 두곤 졸업 논문을 써야 했지만 딱히 쓸 주제도, 돈벌이 때문에 쓸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괴발개발 썼는데 동기인 조교 녀석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느닷없이 졸업장을 나에게 떡 하니 안겨 주지 않는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76년, 드디어 제대를 했지만 나에게는 아내와 딸 수현이, 아들 용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땅히 삶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나인지라 돈벌이를 위해서는 우선 졸업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졸업 한 학기를 남겨 두곤 졸업 논문을 써야 했지만 딱히 쓸 주제도, 돈벌이 때문에 쓸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괴발개발 썼는데 동기인 조교 녀석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느닷없이 졸업장을 나에게 떡 하니 안겨 주지 않는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어쨌든 입학 당시 "졸업장만 따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며 막을 내린 "유난히" 긴 대학 시절. 당시 문리대에서 보낸 시간은 파리에서도 언제나 뇌리 깊숙이 박혀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그 때의 느낌도 아직 마음 한 켠에 오롯이 남아 있다.
이제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어엿한 대학생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비로서, 그리고 먼저 이 시대를 살았던 선배로서, 내가 지금의 청년들에게 감히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치련다.
"마음의 자유를 누려라. 그것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니…"
/ 정리: 김장효숙 기자
[출처; 유뉴스 2002.3.12]
[나의 대학시절 ⑨] 한겨레 기자된 홍세화씨
홍세화 기자
11년 6개월이라는 긴 나의 대학 시절에 "낭만적 실존", 아니 그 앞에 "어설픈"이라는 말을 붙이면 딱 맞겠다. 그래 "어설픈 낭만적 실존".
하여튼 백수, 그런 백수도 없었다. 무계획에, 무책임에. 제대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비유컨대 나의 삶은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였다. 다시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 그 바위를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비극은 처절했지만, 저항이고, 철저한 삶이었듯. 바위로 강을 메우고, 흘러 내려가고, 또 가라 앉더라도 갖다 메우고 또 갖다 메우는 그런 과정.
비유컨대 나의 삶은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였다. 다시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 그 바위를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비극은 처절했지만, 저항이고, 철저한 삶이었듯. 바위로 강을 메우고, 흘러 내려가고, 또 가라 앉더라도 갖다 메우고 또 갖다 메우는 그런 과정. 처음 대학생이라는 꼬리를 단 것은 서울대 공대 금속 공학과 66학번 때였다. 당시로는 최대의 KS마크를 획득한 셈이다. 하지만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영어보다 수학을 잘 해 이과를 선택했을 뿐이니 당최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결석이 잦았고, 결과는 낙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한 치의 변함없는 대학 생활의 방황 끝에 학교를 아예 그만 두고, 다시 정식으로 시험을 쳐 서울대 외교학과 69학번으로 명함을 갈아 치웠다.
외교학과로의 전환은 한반도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궁금해 선택했지만 그마저도 나와 대학을 묶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닥치는대로 책을 파고 들었다. 리영희 선생의 <전환 시대의 논리>는 물론, <공산당 선언>, 보들레르의 <악의 꽃>, 베를레느와 랭보의 작품들도 두루두루 나의 손을 거쳐 갔다.
이렇게 대학에 대한 회의는 쌓여만 갔고, 잠재울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의 발길은 동숭동 문리대 건너편 학림 다방으로 닿았다. 이 곳은 문리대 낭만파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였다. 언제나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차를 마시지 않고도 앉자 있을 수 있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안겨 줬기 때문일까.
그러면서 자연스레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고,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등 부숴대는 음악들을 들어댔다.
또 이때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이걸 연애라고 믿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연애인가 싶기도 하다. 3개월에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만나서는 사귀고, 딱히 할 일 없으면 빵집에서 죽치기 일쑤였다.
또 나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담배"였다. 대학을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담배 피는 거였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알만 하지 않나. 도통 술은 못하면서, 담배는 하루에 세 갑을 피워, "염소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따라 다녔다.
이렇게 조용조용한 나의 삶과는 달리 학내에서는 1학년 때부터 소리 없는 저항이 여기저기서 숨쉬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이니, 교련 반대 투쟁이니 이래저래 대학생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일들이 숱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투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행여나 발언을 하는 일이 있어 대중 앞에 쉽사리 나서면 얼굴부터 발갛게 달아오르는 나이기에 부러울 뿐이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자 문리대 연극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나를 유인한 것은 연극반 회장을 맡고 있던 임진택이었지만, 유난히 수줍음 많고 소심한 성격 탓에 망설이는 나에게 지하형의 등장은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 줬다. 당시 연극을 통해 통해 바라본 그는 등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 연극은 제대로 무대에 올려진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 풍자하는 연극인지라 학교에서 쉽게 허가 해 줄 리 만무했다.
한편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던 터라 반군사 파쇼독재 학생 운동은 계속됐다. 나는 연극에 여념이 없었고, 내 습작으로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더불어 대학가 지하 신문도 제작하고 종종 투쟁에 선동가가 아닌 학생 대중의 일원으로 참여하곤 했다. 이러한 투쟁 분위기는 무르익어, 급기야 임시 휴교령까지 내려졌고, 일체 서클 활동과 집회도 금지 당했다.
그러다 나도 이와 관련해 선언문을 작성, 낭독했다는 이유로 중앙 정보부에 끌려갔고 이때의 기억은 여전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물론 그닥 문제 될 것이 없어 풀려났지만, 학교에서는 제적을 당했고, 이듬해 학교측에서는 한시적으로 제적 당한 학생들을 구해 줘, 행인지 불인지 다시 학교로 돌아 올 수 있게 됐다.
이후 나는 입대를 해야했고, 입대 일주일을 앞두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나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군대 시절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모를 당해야 했으니.
 76년, 드디어 제대를 했지만 나에게는 아내와 딸 수현이, 아들 용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땅히 삶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나인지라 돈벌이를 위해서는 우선 졸업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졸업 한 학기를 남겨 두곤 졸업 논문을 써야 했지만 딱히 쓸 주제도, 돈벌이 때문에 쓸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괴발개발 썼는데 동기인 조교 녀석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느닷없이 졸업장을 나에게 떡 하니 안겨 주지 않는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76년, 드디어 제대를 했지만 나에게는 아내와 딸 수현이, 아들 용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땅히 삶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나인지라 돈벌이를 위해서는 우선 졸업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졸업 한 학기를 남겨 두곤 졸업 논문을 써야 했지만 딱히 쓸 주제도, 돈벌이 때문에 쓸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괴발개발 썼는데 동기인 조교 녀석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느닷없이 졸업장을 나에게 떡 하니 안겨 주지 않는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어쨌든 입학 당시 "졸업장만 따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며 막을 내린 "유난히" 긴 대학 시절. 당시 문리대에서 보낸 시간은 파리에서도 언제나 뇌리 깊숙이 박혀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그 때의 느낌도 아직 마음 한 켠에 오롯이 남아 있다.
이제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어엿한 대학생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비로서, 그리고 먼저 이 시대를 살았던 선배로서, 내가 지금의 청년들에게 감히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치련다.
"마음의 자유를 누려라. 그것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니…"
/ 정리: 김장효숙 기자
[출처; 유뉴스 2002.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