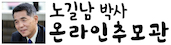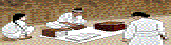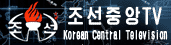23박 24일의 철도 여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6-30 00:00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민경우의 "약소민족 반제투쟁사" -북한②
2001년 7월 26일 이북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통과한 특별 열차는 시베리아 횡단철로를 따라 만 8일 여행한 끝에 8월 3일 모스크바 야로슬라브 역에 도착했다. 숙소인 크렘린 특별 영빈관에 여장을 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크렘린 광장 앞의 무명용사묘와 레닌묘에 헌화하고 8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역사적인 조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김정일국방위원장. / NK조선
▲러시아를 방문중인 김정일국방위원장. / NK조선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려 23박 24일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먼저 20일이 넘는 장기 외유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이 특별한 기록에 대해 시사저널 658호(2002/6/06자)에서 정다원 특파원은 "러시아 정보기관은 김위원장의 장기 외유에 따른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김위원장 체제가 대단히 확고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도 모든 통로를 총동원해 북한 상황을 점검하고 심지어 특별 공작 가능성까지 검토했으나 결코 허물 수 없는 체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다음으로 레닌묘를 헌화한 점이다. 소련의 창시자 레닌은 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인민들에 의해 동상이 철거되었다. 레닌묘가 철거되는 장면은 소련 붕괴의 상징처럼 전 세계에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레닌묘소에 참배한 국가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끝으로 철도를 통한 방문이 갖는 상징적 의의이다. 이북이 사전 답사팀까지 보내 총연장 9288km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김위원장의 방러 코스로 선택한 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 구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2001년 가을로 돌아가 보자.
부시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한반도 내정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2000년 12월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이 지원하기로 한 북에 대한 전력 지원에 제동을 걸었으며 2001년 2월에는 금강산 관광 경비 4억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며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정점은 아마도 2001년 3월에 있은 한미 정상회담일 것이다. 77살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2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54살의 부시 대통령은 "this man" 운운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구애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말았다.
2001년 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잉태된 통일조국의 열망은 그렇게 짓밟히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출현으로 이북 또한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다.
부시 대통령의 눈에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불량국가" 이북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양보를 거듭한 것으로 비추어 졌다. 근육질로 무장한 카우보이 부시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세를 마음껏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부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위험한 모험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뒤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 대화하자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날렸다.(이것이 6.6 대북대화재개 선언이다) 부시의 머릿속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북과 미국이 맺었던 모든 합의와 약속들은 이미 안중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답이 23박 24일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일이 넘는 기간 나라를 비우고 이미 망해버린 사회주의의 창시자에게 헌화하여 미국식 자본주의와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과 8.4 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한다.
모스크바 선언에는 조러간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협력, 6.15 선언에 대한 지지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흥미있는 것은 경제협력 분야이다. 양국은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북의 전력 부분의 현대화에 러시아가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철도 여행을 택한 것은 철도 연결 구상을 전 세계에 시위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2002년 접어 들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전력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는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특히 에너지 분야의 봉쇄에 파열구가 내고 있었다.
[출처; 유뉴스 unews@unews.co.kr]
2001년 7월 26일 이북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통과한 특별 열차는 시베리아 횡단철로를 따라 만 8일 여행한 끝에 8월 3일 모스크바 야로슬라브 역에 도착했다. 숙소인 크렘린 특별 영빈관에 여장을 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크렘린 광장 앞의 무명용사묘와 레닌묘에 헌화하고 8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역사적인 조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김정일국방위원장. / NK조선
▲러시아를 방문중인 김정일국방위원장. / NK조선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려 23박 24일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먼저 20일이 넘는 장기 외유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이 특별한 기록에 대해 시사저널 658호(2002/6/06자)에서 정다원 특파원은 "러시아 정보기관은 김위원장의 장기 외유에 따른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김위원장 체제가 대단히 확고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도 모든 통로를 총동원해 북한 상황을 점검하고 심지어 특별 공작 가능성까지 검토했으나 결코 허물 수 없는 체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다음으로 레닌묘를 헌화한 점이다. 소련의 창시자 레닌은 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인민들에 의해 동상이 철거되었다. 레닌묘가 철거되는 장면은 소련 붕괴의 상징처럼 전 세계에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레닌묘소에 참배한 국가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끝으로 철도를 통한 방문이 갖는 상징적 의의이다. 이북이 사전 답사팀까지 보내 총연장 9288km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김위원장의 방러 코스로 선택한 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 구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2001년 가을로 돌아가 보자.
부시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한반도 내정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2000년 12월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이 지원하기로 한 북에 대한 전력 지원에 제동을 걸었으며 2001년 2월에는 금강산 관광 경비 4억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며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정점은 아마도 2001년 3월에 있은 한미 정상회담일 것이다. 77살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2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54살의 부시 대통령은 "this man" 운운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구애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말았다.
2001년 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잉태된 통일조국의 열망은 그렇게 짓밟히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출현으로 이북 또한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다.
부시 대통령의 눈에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불량국가" 이북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양보를 거듭한 것으로 비추어 졌다. 근육질로 무장한 카우보이 부시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세를 마음껏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부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위험한 모험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뒤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 대화하자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날렸다.(이것이 6.6 대북대화재개 선언이다) 부시의 머릿속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북과 미국이 맺었던 모든 합의와 약속들은 이미 안중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답이 23박 24일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일이 넘는 기간 나라를 비우고 이미 망해버린 사회주의의 창시자에게 헌화하여 미국식 자본주의와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과 8.4 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한다.
모스크바 선언에는 조러간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협력, 6.15 선언에 대한 지지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흥미있는 것은 경제협력 분야이다. 양국은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북의 전력 부분의 현대화에 러시아가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철도 여행을 택한 것은 철도 연결 구상을 전 세계에 시위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2002년 접어 들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전력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는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특히 에너지 분야의 봉쇄에 파열구가 내고 있었다.
[출처; 유뉴스 unews@u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