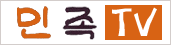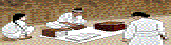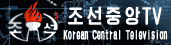[안광획의 새세대 청춘송가] 과학이 아니라 침략의 도구였다 일본군이 낳은 일본 역사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025-03-12 18:33 조회2,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광획의 새세대 청춘송가] 과학이 아니라 침략의 도구였다 일본군이 낳은 일본 역사학
일본 역사학은 시초부터 대학이 아닌 군대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
그러했기에 철두철미 일제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어용, 관제 역사학이었고, 과학적 연구나 중립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과학’이란 단지 천황제와 식민지배, 대외침략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기에 앞선 글들에서 보았듯 사료나 유물도 조작하고, 불리한 유적・유물은 은폐, 파괴해 버리는 짓을 거리낌 없이 벌일 수 있던 것이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역사학은 대학에 설립된 사학과나 박물관,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료(문헌자료)와 유적・유물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는 학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역사학도 다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 같이 명확한 논리와 증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진지하게 그려낼 것을 요구한다. 이는 폭 넓게 퍼져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학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일본 역사학은 뿌리부터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탄생 과정을 거쳤다. 바로, 나라를 지키거나 외적을 무찌르는 군대에서 역사학이 잉태된 것이다. 얼핏 듣기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경악할 만한 사건이 19세기 말 일본에서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일본군이 일본 역사학을 탄생시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군 참모본부, 일본 근대역사학을 잉태하다

사진 및 그림: 일본 역사학의 모태 일본군 참모본부(1910년대) 전경과 참모본부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서 내놓은 [황조병사]
19세기 말, 서구 열강의 지원 아래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본격적으로 해외 침략에 박차를 가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에 대한 침탈을 시작했고, 청일-러일전쟁 등을 거치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장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조선(한반도)을 발판으로 삼아 만주, 중원까지 집어삼키며 아시아의 맹주가 될 야욕을 불태워 나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륙침략 과정에서, 역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고대 역사서에서 선대 천황(신공황후, 응신천황, 인덕천황 등)이 바다를 건너 삼한을 정벌했다는 기사나, 고대 일본이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기사, 당나라와 신라의 침공으로 멸망 위기에 처한 ‘제후국’ 백제를 도와 구원병을 파견했다는 기사(백강 전투) 등 고대 일본의 대외관계 기사들은 일제의 조선 및 대륙침략의 야욕을 부채질하였고,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침략 수단으로서 역사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았던 일제는 일본군 참모본부에 역사 연구 부서를 설치하고, 1872~1873년경부터 이들을 정보원으로 조선에 잠입시켰다. 조선에 파견된 역사 연구 정보원들은 조선과 만주의 역사, 지리, 문화풍습 등 자료들을 수집, 조사하였고, 특히 고대 일본이 대륙에 ‘진출’한 사료를 탐색하는 데 주목을 돌렸다.
일련의 과정 끝에, 1880년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는 조선, 만주 일대에 파견한 정보원들의 역사·지리·문화 관련 수집 사료와 고대 일본 역사서들을 바탕으로 고대 일본의 대외 전쟁사를 서술한 책인 『황조병사(皇朝兵史)』를 내놓았다. 임나일본부설, 신공황후 삼한정벌설 삼국의 일본 조공설 등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내용으로 점철된 『황조병사』는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 교재로 사용되었고, 이들을 침략전쟁으로 더욱 내몰았다. 또한, 일본군 참모본부는 1883년에 임나일본부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연구 서적인 『임나고고(任那考稿)』를 내놓으며 침략 수단으로서의 역사 연구에 더욱 매진하였다.
![(사진: 사코 가게노부(좌)와 일본군의 [광개토왕릉비] 탁본 장면)](https://cdn.tongiltimes.com/news/photo/202503/2777_7311_419.png) (사진: 사코 가게노부(좌)와 일본군의 [광개토왕릉비] 탁본 장면)
(사진: 사코 가게노부(좌)와 일본군의 [광개토왕릉비] 탁본 장면)일본군 참모본부의 역사 연구는 『광개토왕릉비』의 발견으로 더욱 크게 확장되었다. 서지적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하여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대륙에 진출했다는 설을 조작했지만, 이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유물)가 없어 일제는 고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1884년에 조선~만주에 파견된 정보원 중 한 명인 육군 대위 사코 가게노부(酒勾景信)가 만주에서 『광개토왕릉비』 탁본을 구해왔다.
능비 탁본에서의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잔, OO, 신라를 쳐 신민으로 삼았다”는 구절을 보고 일본군 참모본부는 드디어 임나일본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열광했고, 당대 일본 최고의 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총동원하여 탁본 번역 및 해석에 매진하였다.(그 문제의 신묘년 기사와 『광개토왕릉비』 탁본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해 동안의 연구 끝에, 일본군 참모본부는 그 연구 성과를 학술지 『회여록(會餘錄)』 제5집(1889.02.)에 수록, 발표했다. 또한, 이와 같은 능비 연구 성과들은 일본군 정훈교육에 갱신, 추가되면서 일제 조선 식민지배 및 대륙침략 명분을 더욱 튼튼히 뒷받침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일본군 참모본부가 주도한 『광개토왕릉비』 연구 과정에 수많은 역사학자와 한학자들이 동원된 것이다. 간 마사토모(管政友), 요코이 다다나오(橫井忠直), 나카 미찌요(那珂通世) 등의 학자들은 이때 능비 연구에 참가하며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을 형성하였고, 이들은 이후 일본 전역의 제국대학에 속속 설치되는 사학과에 배치되어 역사 연구와 후학양성을 이어나갔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황조병사』, 『임나고고』, 『광개토왕릉비』 연구 성과 등 일본군 참모본부 출판 역사서들은 대학 사학과들에 널리 보급, 전파되어 역사 연구 기초사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왜 학계가 아닌 군대가 역사 연구를 하면 안 되는가?’ 이는 군대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 때문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군대는 국가(영토, 주권, 인민)를 지키거나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의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무찌르는 무력 집단이다. 이와 같은 특성상, 군대에서 벌이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을 무찌르는 데 모든 것을 복무할 수밖에 없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마키아벨리)하는 것이며 여기서 과학성, 중립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당시 일본군은 어떠한 무력이던가? 천황제를 옹호하고 일본제국의 팽창을 위해 내외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한 제국주의 침략 무력 아니던가? 당연히 그런 군대에서 연구하는 역사 연구란 천황제와 일제 침략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후술하겠지만 그런 역사 연구성과를 받아 안은 일본 근대역사학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일본군 참모본부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침략전쟁에 동조한 일본 근대역사학
 (사진: 일본군 만선역사지리조사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본 학계에 ‘만선사관’을 형성한 사학자들.시라토리 구라키찌-이케우찌 히로시-쯔다 소키찌 순)
(사진: 일본군 만선역사지리조사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본 학계에 ‘만선사관’을 형성한 사학자들.시라토리 구라키찌-이케우찌 히로시-쯔다 소키찌 순)그렇다면 일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학계가 생겨난 것은 언제일까? 이르게 잡더라도 도쿄제국대학(이하 도쿄제대) 산하에 사학과를 설치한 것이 1887년이었고, 본격적으로 일본 근대역사학계가 형성된 것은 도쿄제대 사학과 내에 40명의 학자들로 사학회(史學會)가 출범한 1889년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1870년대부터 내부에 역사 연구 부서를 설치하고 ‘역사 연구’를 추진한 일본군 참모본부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도쿄제대를 시작으로 교토제대(1897년), 도호쿠제대(1907년), 규슈제대(1911년) 등 각지에 제국대학들이 세워지며 각각 대학 법문학부 산하에 사학과가 설치되며 일본 근대 역사학이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도쿄제대 사학회를 위시한 당시 일본 근대 역사학계는 당시 서구(특히 독일)에서 유행하던 역사 연구 흐름인 L.랑케(Leopold von Ranke)의 실증적 연구방법론(실증주의 사학)을 받아들여 역사 연구에서의 사료 고증을 통한 과학적, 가치중립적 연구를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그 원천은 일본군 참모본부의 왜곡된 ‘역사 연구’ 성과였고, 이들이 내세운 실증주의 연구방법론은 단지 일본군 참모본부의 ‘연구 성과’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도쿄제대 사학과 산하 사학회 인사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본군 참모본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앞서 보았듯 『광개토왕릉비』 연구에 참여한 간 마사토모, 나카 미찌요 등이 도쿄제대 사학회 발기 명단에 포함되었고, 그 후학들인 시라토리 구라키찌(白鳥庫吉, 나카 미찌요의 제자),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도쿄제대 졸업생),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도쿄제대 졸업생) 등도 각각 국사(=일본사), 동양사(조선사, ‘지나사(중국사)’) 등을 맡으며 일본군 참모본부 역사연구를 계승하거나 천황제,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학술지 『사학회잡지(史學會雜志)』(1892년 『사학잡지』로 개칭)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08년에는 일제가 만주침략을 위해 세운 철도회사인 만주철도주식회사 산하에 만주와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만선역사지리조사부가 설치되었는데, 그 과정을 시라토리 구라키찌가 주도하였다. 또한, 만선역사지리조사부 활동 과정에서 시라토리는 후학으로 이케우찌 히로시(池內宏), 이나바 이와키찌(稻葉岩吉), 쯔다 소키찌(津田左右吉) 등을 양성하며 ‘조선 역사는 만주 역사의 하위 역사였다’는 만선사관(滿鮮史觀)을 형성하였다. 바로, 이때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서 시라토리 아래서 육성된 이들이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는 것이고, 식민사관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결국, 일본 근대 역사학은 대학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침략전쟁을 주도하는 일본군이 토대를 만들고 이를 학계에 이식하여 생겨났으며, 이는 식민지 조선에까지 퍼져 식민사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즉, 일본군이 일본 근대 역사학과 식민사관을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역사학의 본질: 과학이 아니라 침략의 도구!
이렇듯, 일본 역사학은 시초부터 대학이 아닌 군대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 그러했기에 철두철미 일제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어용, 관제 역사학이었고, 과학적 연구나 중립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과학’이란 단지 천황제와 식민지배, 대외침략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기에 앞선 글들에서 보았듯 사료나 유물도 조작하고, 불리한 유적・유물은 은폐, 파괴해 버리는 짓을 거리낌 없이 벌일 수 있던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