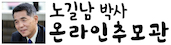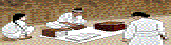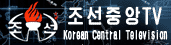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신간]작가 정호일: <광개토호태왕> 장편소설 3권 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5-11-08 23:37 조회2,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편소설 "광개토호태왕"이 3권으로 출판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겨레 출판사가 정호일 작가의 장편소설을 3권으로 펴냈다. 이에 대해 한신대 김상일 교수는 "정호일 선생의 ‘광개토호태왕’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자주국방 그리고 자주역량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실존인물을 자주역량에 대입시켜 형상화한 유일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교수의 서평을 소개한다.[민족통신/평화통신 편집실]
.....................................................................................
자주역량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광개토대왕
[서평] 소설 <광개토호태왕>...실존인물을 통한 천손사상의 실현
*서평:김상일 교수(한신대 철학과 교수)*
<##IMAGE##> 나는 금년 7월 24-26일 3일간 중국 집안 국내성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나는 집안에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하나는 우리의 과거이고 하나는 우리의 현실이었다. 즉 앞에 마주 보이는 산이 바로 북한이고 그 사이에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 집안의 지형에 놀랐고, 고구려의 과거 역사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미 강만 하나 건너면 남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탄식을 한 우리 조상들의 글들이 실감이 났다. 집안 시내에 들어서서 아직 산천은 의구한 통구의 강과 노량산맥 산천은 광개토호태왕이 말 달리던 그 때 모습을 상상 속에 그릴 수 있었다.
신라가 원망스럽고 백제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민족끼리 싸우다가 지는 쪽이 승복하는 것이 먼 역사를 위해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 한다. 어느 경우든지 외세를 끌어들여 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정호일 선생의 ‘광개토호태왕’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자주국방 그리고 자주역량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광개토호태왕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담덕이란 이름으로 그의 어린시절부터 그려 나가는 이 소설은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에서 기득권자들의 저항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한다. 이순신이 평생토록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고뇌를 겪는 것을 우리는 안다. 광개토호태왕도 예외는 아니다.
그 사이에서 광개토호태왕은 슬기롭게도 그런 정치적 복마전을 극복하고 드디어 5000년 우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된다. 우리는 조선조의 광해군을 광개토호태왕과 비교해 본다. 만약에 호태왕도 그 당시 정쟁의 희생물이 되었다면 그의 이름은 지금 역사의 위대한 장을 장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광해군도 만약에 그 당시 기득권세력을 호태왕 같이 극복 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도 위대한 왕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소설의 제1권에서 나는 계속 광해군과 비교 하며 글을 읽어 나갔다. 이것은 영웅이 되고 안 되고는 실로 순간의 판단 착오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 소설의 백미는 역시 제3권에 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나는 이 소설을 종교 소설로도 생각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광개토호태왕은 그의 비문 첫 구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 온 천손의 후예라는 것이다. 고주몽은 스스로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했으며 광개토호태왕은 그 혈통을 이어 받는다는 자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광개토호태왕이 백제를 징벌하는 이유도 백제가 단군의 같은 후예라는 것을 저버리고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같은 단군후손들을 괴롭히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도 타당하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끊임없이 같은 동족과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외세에 의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광개토호태왕은 지금이라도 응징하려할 것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배울 것인가? 단군 천손족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던지는 궁극적인 입장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천손족이면 무엇이 그렇게 특징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일까. 중국만 하더라도 그들은 천손족이 아니고 천자의 나라라고 자처한다. 그러면 천손과 천자는 무엇이 서로 다른 것인가?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배울 것인가? 단군 천손족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던지는 궁극적인 입장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천손족이면 무엇이 그렇게 특징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일까. 중국만 하더라도 그들은 천손족이 아니고 천자의 나라라고 자처한다. 그러면 천손과 천자는 무엇이 서로 다른 것인가?
그 차이는 엄청나다. 그리고 신화에서도 하늘의 아들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여성세력 타이폰과 만나 서로 결합을 못하고 살해하고 만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 마루두크라는 남신이 티아맛이란 여신을 살해 한다. 인도의 경우도 천신 인드라가 땅의 여신 브리트라를 살해한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결합이 안 되어 신의 손자가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도 마찬가지 있다.
이는 모계에서 부계로 넘어오면서 그 교체기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성 우월적 가치관이 여성 원리들을 압살한 것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사는 천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자사상에 의해 태어난 기형아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남신과 여신이 조화가 안 되면 이는 심각한 문명의 병을 초래한다. 이를 두고 인도-유럽적 균열이라고 한다. 중국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단군신화는 하늘 아들 환웅이 내려와 땅의 웅녀와 결합해 단군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후손이 고주몽이라는 천손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런 천손 후예로서의 긍지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광개토호태왕이시다’ 라는 것이 이 소설 속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천손사상을 단순히 종교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광개토호태왕이라는 실존인물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를 실현하려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해보는 바이다.
*<광개토호태왕> : 지은이 정호일, 도서출판 <우리겨레> 전 3권, 각 9,000원
김상일 교수는 한신대 철학과 교수이자 단군학회 회장으로 단군과 고조선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단군학회는 지난 9월 남북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단군 건국으로부터 민족사의 서술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군과 고조선연구’라는 논문집을 내기도 했다.
.....................................................................................
자주역량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광개토대왕
*서평:김상일 교수(한신대 철학과 교수)*
<##IMAGE##> 나는 금년 7월 24-26일 3일간 중국 집안 국내성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나는 집안에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하나는 우리의 과거이고 하나는 우리의 현실이었다. 즉 앞에 마주 보이는 산이 바로 북한이고 그 사이에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 집안의 지형에 놀랐고, 고구려의 과거 역사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미 강만 하나 건너면 남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탄식을 한 우리 조상들의 글들이 실감이 났다. 집안 시내에 들어서서 아직 산천은 의구한 통구의 강과 노량산맥 산천은 광개토호태왕이 말 달리던 그 때 모습을 상상 속에 그릴 수 있었다.
신라가 원망스럽고 백제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민족끼리 싸우다가 지는 쪽이 승복하는 것이 먼 역사를 위해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 한다. 어느 경우든지 외세를 끌어들여 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정호일 선생의 ‘광개토호태왕’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자주국방 그리고 자주역량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광개토호태왕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담덕이란 이름으로 그의 어린시절부터 그려 나가는 이 소설은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에서 기득권자들의 저항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한다. 이순신이 평생토록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고뇌를 겪는 것을 우리는 안다. 광개토호태왕도 예외는 아니다.
그 사이에서 광개토호태왕은 슬기롭게도 그런 정치적 복마전을 극복하고 드디어 5000년 우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된다. 우리는 조선조의 광해군을 광개토호태왕과 비교해 본다. 만약에 호태왕도 그 당시 정쟁의 희생물이 되었다면 그의 이름은 지금 역사의 위대한 장을 장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광해군도 만약에 그 당시 기득권세력을 호태왕 같이 극복 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도 위대한 왕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소설의 제1권에서 나는 계속 광해군과 비교 하며 글을 읽어 나갔다. 이것은 영웅이 되고 안 되고는 실로 순간의 판단 착오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 소설의 백미는 역시 제3권에 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나는 이 소설을 종교 소설로도 생각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광개토호태왕은 그의 비문 첫 구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 온 천손의 후예라는 것이다. 고주몽은 스스로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했으며 광개토호태왕은 그 혈통을 이어 받는다는 자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광개토호태왕이 백제를 징벌하는 이유도 백제가 단군의 같은 후예라는 것을 저버리고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같은 단군후손들을 괴롭히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도 타당하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끊임없이 같은 동족과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외세에 의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광개토호태왕은 지금이라도 응징하려할 것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배울 것인가? 단군 천손족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던지는 궁극적인 입장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천손족이면 무엇이 그렇게 특징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일까. 중국만 하더라도 그들은 천손족이 아니고 천자의 나라라고 자처한다. 그러면 천손과 천자는 무엇이 서로 다른 것인가?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배울 것인가? 단군 천손족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던지는 궁극적인 입장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천손족이면 무엇이 그렇게 특징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일까. 중국만 하더라도 그들은 천손족이 아니고 천자의 나라라고 자처한다. 그러면 천손과 천자는 무엇이 서로 다른 것인가? 그 차이는 엄청나다. 그리고 신화에서도 하늘의 아들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여성세력 타이폰과 만나 서로 결합을 못하고 살해하고 만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 마루두크라는 남신이 티아맛이란 여신을 살해 한다. 인도의 경우도 천신 인드라가 땅의 여신 브리트라를 살해한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결합이 안 되어 신의 손자가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도 마찬가지 있다.
이는 모계에서 부계로 넘어오면서 그 교체기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성 우월적 가치관이 여성 원리들을 압살한 것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사는 천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자사상에 의해 태어난 기형아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남신과 여신이 조화가 안 되면 이는 심각한 문명의 병을 초래한다. 이를 두고 인도-유럽적 균열이라고 한다. 중국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단군신화는 하늘 아들 환웅이 내려와 땅의 웅녀와 결합해 단군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후손이 고주몽이라는 천손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런 천손 후예로서의 긍지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광개토호태왕이시다’ 라는 것이 이 소설 속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천손사상을 단순히 종교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광개토호태왕이라는 실존인물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를 실현하려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해보는 바이다.
*<광개토호태왕> : 지은이 정호일, 도서출판 <우리겨레> 전 3권, 각 9,000원
김상일 교수는 한신대 철학과 교수이자 단군학회 회장으로 단군과 고조선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단군학회는 지난 9월 남북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단군 건국으로부터 민족사의 서술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군과 고조선연구’라는 논문집을 내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