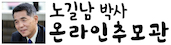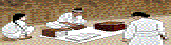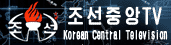어수갑씨, 18년 유배생활 책펴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5-01-12 00:00 조회1,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베를린서 통일운동하다가 임수경씨 방북 배후인물로 몰려 18년 유배생활하던 어수갑씨(50)가 최근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한겨레가 소개한 이 책과 관련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
18년 유배 ‘베를린 리포트’
비뚤어진 역사,
평범한 인간을 어떻게 바꿨나
 △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어수갑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1만2000원
△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어수갑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1만2000원
들꽃. 이름 모를 들꽃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를 돌려세웠다. 독일 알프스 어느 산속에서 자살할 자리를 찾던 그의 눈에 잔설을 뚫고 돋아난 들꽃이 비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처음으로 신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었다. 자살 직전 그를 압도한 들꽃은,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경외’는 그를 살리고자 절대자가 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삶과 대면하기 직전까지 그, 어수갑(50)씨는 90년대 초반 내내 ”밥을 먹는 횟수만큼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야했다. 아내와 헤어지고, 세탁기 설치할 공간조차 없는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두 목숨을 건사해야 하는 것은 차라리 나았다.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그가 같은 처지라고 믿었던 유학생 동지들까지 모두 그의 곁에서 사라진 것은 그에게 ‘지옥’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틀린 역사에 휩쓸려 간첩이자 공작원으로 낙인찍힌 독일 유학생은 그렇게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다. 그런 그를 다행히 신앙의 힘이 건져냈던 것이다.
‘임수경 방북’배후 몰려
고통의 삶 보낸 어수갑씨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인 머나먼 유럽 땅에서도 분단과 독재라는 현대사를 고민하며 투쟁했던 이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어씨만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이들은 결코 겪지 않았을 운명을 짊어져야 했다. ‘임수경 방북사건’의 배후조종자가 되어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다. ‘독일판 홍세화’, ‘베를린판 파리의 택시운전사’가 바로 그다. 팔팔했던 30대 초반에 독일로 떠난 유학생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50대 중년이 됐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평범치 않았던 인생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는 평안을 얻어 이 책을 썼다. 그의 말대로 책은 “비뚤어진 역사가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를 전하는 사적인 이야기”다.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너무나 담담하기만 하다.
독일 통일 직전 어씨가 유럽민협 회원들과 함께 베를린 장벽에 새긴 통일 염원 글귀(맨 위). 1987년 6월항쟁 당시 독일 본에서도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동참했다(가운데). 맨 아래는 ‘임수경 방북사건’으로 유배생활을 끝낸 어씨가 15년 만에 당시 사건의 주역들과 만난 사진. 왼쪽부터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 임수경씨, 어수갑씨.
“들꽃에게 배운 새 인생
난 경계인 아닌 교량인”
 어씨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89년 6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당시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유럽민협) 총무였던 그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베를린에 온 임수경씨를 유럽한인청년 대표를 인솔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사 사장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전대협 대표가 독일을 경유해 평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한겨레>에 팩스로 알리기도 했다. 그가 전한 뉴스는 이튿날 1면 톱기사로 한국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졸지에 ‘간첩’보다도 더 거물급에 해당되는 ‘공작원’으로 몰렸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그를 ‘제1피의자’로, 임수경씨를 ‘제2피의자’로 올렸을 정도였다.
어씨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89년 6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당시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유럽민협) 총무였던 그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베를린에 온 임수경씨를 유럽한인청년 대표를 인솔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사 사장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전대협 대표가 독일을 경유해 평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한겨레>에 팩스로 알리기도 했다. 그가 전한 뉴스는 이튿날 1면 톱기사로 한국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졸지에 ‘간첩’보다도 더 거물급에 해당되는 ‘공작원’으로 몰렸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그를 ‘제1피의자’로, 임수경씨를 ‘제2피의자’로 올렸을 정도였다.
화는 일순간에 덮쳤지만 이를 극복하는 깨달음은 그야말로 서서히, 또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대가로 얻을 수 있었다. 자살 미수 이후, 어씨는 아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남아야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운동 역시 운동권 내부의 갈등에 지쳐 손을 떼고 말았다. 선배 홍세화씨처럼 ‘택시운전사’가 되려고도 했지만 길눈이 어두워 포기했다. 대신 무의탁 노인들 간병인이 되어 독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돌보면서 생계를 꾸렸다. 그의 동반자가 되어준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어느 정도 안정이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간병일로 손목과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다.
지난 1999년, 그는 양심서약서를 쓰고 안기부의 조사를 받아 마침내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동기들은 벌써 ‘명퇴’ 대상이 돼버린 세대의 모습들이었다. 발전했다고는 해도 고국의 상황은 그를 매번 아쉽게 만든다. 그는 그토록 오고파했던 이 조국이 ‘라디칼’(radikal·‘근본적인’ ‘급진적인’이란 뜻)해지기를, 그러면서도 결코 ‘엑스트렘’(extrem·‘극단적인’이란 뜻)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엑스트렘은 ‘관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그네의 운명을 경험해서일까, 그는 스스로 ‘경계인’이 아니라 ‘교량인’이 되고자 한다. 교량인은 서로 다른 집단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 ‘화해자’가 되는 사람이다. 성공을 위한 경영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인생에 실패한” 자신의 글을 독자들에게 권하기 미안해하면서도, 그가 ‘순정한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자하는 이유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출처:인터넷 한겨레 2004.11.26]
.....................................................................
18년 유배 ‘베를린 리포트’
비뚤어진 역사,
평범한 인간을 어떻게 바꿨나
 △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어수갑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1만2000원
△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어수갑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1만2000원 들꽃. 이름 모를 들꽃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를 돌려세웠다. 독일 알프스 어느 산속에서 자살할 자리를 찾던 그의 눈에 잔설을 뚫고 돋아난 들꽃이 비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처음으로 신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었다. 자살 직전 그를 압도한 들꽃은,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경외’는 그를 살리고자 절대자가 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삶과 대면하기 직전까지 그, 어수갑(50)씨는 90년대 초반 내내 ”밥을 먹는 횟수만큼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야했다. 아내와 헤어지고, 세탁기 설치할 공간조차 없는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두 목숨을 건사해야 하는 것은 차라리 나았다.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그가 같은 처지라고 믿었던 유학생 동지들까지 모두 그의 곁에서 사라진 것은 그에게 ‘지옥’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틀린 역사에 휩쓸려 간첩이자 공작원으로 낙인찍힌 독일 유학생은 그렇게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다. 그런 그를 다행히 신앙의 힘이 건져냈던 것이다.
‘임수경 방북’배후 몰려
고통의 삶 보낸 어수갑씨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인 머나먼 유럽 땅에서도 분단과 독재라는 현대사를 고민하며 투쟁했던 이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어씨만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이들은 결코 겪지 않았을 운명을 짊어져야 했다. ‘임수경 방북사건’의 배후조종자가 되어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다. ‘독일판 홍세화’, ‘베를린판 파리의 택시운전사’가 바로 그다. 팔팔했던 30대 초반에 독일로 떠난 유학생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50대 중년이 됐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평범치 않았던 인생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는 평안을 얻어 이 책을 썼다. 그의 말대로 책은 “비뚤어진 역사가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를 전하는 사적인 이야기”다.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너무나 담담하기만 하다.
독일 통일 직전 어씨가 유럽민협 회원들과 함께 베를린 장벽에 새긴 통일 염원 글귀(맨 위). 1987년 6월항쟁 당시 독일 본에서도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동참했다(가운데). 맨 아래는 ‘임수경 방북사건’으로 유배생활을 끝낸 어씨가 15년 만에 당시 사건의 주역들과 만난 사진. 왼쪽부터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 임수경씨, 어수갑씨.
“들꽃에게 배운 새 인생
난 경계인 아닌 교량인”
 어씨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89년 6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당시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유럽민협) 총무였던 그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베를린에 온 임수경씨를 유럽한인청년 대표를 인솔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사 사장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전대협 대표가 독일을 경유해 평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한겨레>에 팩스로 알리기도 했다. 그가 전한 뉴스는 이튿날 1면 톱기사로 한국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졸지에 ‘간첩’보다도 더 거물급에 해당되는 ‘공작원’으로 몰렸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그를 ‘제1피의자’로, 임수경씨를 ‘제2피의자’로 올렸을 정도였다.
어씨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89년 6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당시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유럽민협) 총무였던 그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베를린에 온 임수경씨를 유럽한인청년 대표를 인솔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사 사장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전대협 대표가 독일을 경유해 평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한겨레>에 팩스로 알리기도 했다. 그가 전한 뉴스는 이튿날 1면 톱기사로 한국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졸지에 ‘간첩’보다도 더 거물급에 해당되는 ‘공작원’으로 몰렸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그를 ‘제1피의자’로, 임수경씨를 ‘제2피의자’로 올렸을 정도였다. 화는 일순간에 덮쳤지만 이를 극복하는 깨달음은 그야말로 서서히, 또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대가로 얻을 수 있었다. 자살 미수 이후, 어씨는 아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남아야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운동 역시 운동권 내부의 갈등에 지쳐 손을 떼고 말았다. 선배 홍세화씨처럼 ‘택시운전사’가 되려고도 했지만 길눈이 어두워 포기했다. 대신 무의탁 노인들 간병인이 되어 독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돌보면서 생계를 꾸렸다. 그의 동반자가 되어준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어느 정도 안정이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간병일로 손목과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다.
지난 1999년, 그는 양심서약서를 쓰고 안기부의 조사를 받아 마침내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동기들은 벌써 ‘명퇴’ 대상이 돼버린 세대의 모습들이었다. 발전했다고는 해도 고국의 상황은 그를 매번 아쉽게 만든다. 그는 그토록 오고파했던 이 조국이 ‘라디칼’(radikal·‘근본적인’ ‘급진적인’이란 뜻)해지기를, 그러면서도 결코 ‘엑스트렘’(extrem·‘극단적인’이란 뜻)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엑스트렘은 ‘관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그네의 운명을 경험해서일까, 그는 스스로 ‘경계인’이 아니라 ‘교량인’이 되고자 한다. 교량인은 서로 다른 집단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 ‘화해자’가 되는 사람이다. 성공을 위한 경영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인생에 실패한” 자신의 글을 독자들에게 권하기 미안해하면서도, 그가 ‘순정한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자하는 이유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출처:인터넷 한겨레 2004.1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