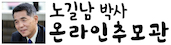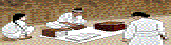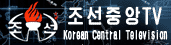백인백일 걷기운동 김치환팀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 작성일02-10-23 00:00 조회1,5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의 현장팀장을 맡았던 김치환씨는 귀농을 준비하는 34살의 노총각이다. 『작은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농민, 도시빈민, 비정규직 관련 아이템을 준비하는 일이 100일 걷기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의 직업이었다.
 일년남짓 귀농(歸農)을 준비하던 그는 귀농학교에서 정경식 정농회 부회장으로부터 걷기운동 참여를 제안받는다. 마침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준비를 하던 그는 "귀농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 100일 걷기에 참여한다.
일년남짓 귀농(歸農)을 준비하던 그는 귀농학교에서 정경식 정농회 부회장으로부터 걷기운동 참여를 제안받는다. 마침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준비를 하던 그는 "귀농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 100일 걷기에 참여한다.
그와 걷기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7월1일 진도를 떠나 10월 13일 서울에 들어오기까지 105일 동안 1900여 KM를 걸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45회를 완주한 셈. 이봉주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합쳐 28번의 마라톤을 완주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대단한 거리이다.
그들은 왜 걸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그들이 걷기를 시작한 곳이 말해준다.
<고려시대 삼별초와 WTO시대의 걷기운동>
"여름은 국토순례의 계절이지요. 대학생들의 국토순례도 그렇고... 보통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장산성은 고려때 강화도에서 밀려난 삼별초의 항몽 전적지다.
"고려정부도 몽고에 투항을 했고, 몽고는 당시에 대제국이었고 결국 강화도에서 밀려나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13년간 대몽항쟁을 했던 삼별초와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삼별초가 "이긴다"는 믿음으로 싸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삼별초는 그 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WTO의 거대한 물결을 이겨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쌀개방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열다섯명이 걸었구요. 7월 1일에 진도에 가니까 실상사에서 오신 스님 두분하고, 대변인을 맡은 김재형씨하고 그 분 딸, 이렇게 19명이 시작을 했구요. 보성에서 열네살 한네, 남원에서 수연이, 8월 7일경에는 치유공동체의 아이들도 참여를 했구요. 시작하고 50일이 지나면서부터 세른명 넘게 유지가 됐어요. 어른 아이로 나누면 아이들이 절반, 남녀로 나누면 여성이 절반이 됩니다."
 김치환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번에 걸쳐 "걷기운동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끌어간 운동"이며, "걸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자는 김치환씨의 "농업회생"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김치환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번에 걸쳐 "걷기운동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끌어간 운동"이며, "걸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자는 김치환씨의 "농업회생"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 생활속에도 WTO가 있다
"걷기운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입니다. 우리 걷기에도 다섯살의 아이부터 여든살의 어르신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두다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또 걷기운동은 천천히 걷는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성찰이라는 단어자체에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운동에는 WTO라는 분명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WTO로 대표되는 "빠르고, 크게, 효율적으로"라는 흐름이 이미 나의 삶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걸 좀 돌아보자는 거지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냐고 했더니 두 사람을 지목한다.
"하늘빛이라는 분이 있어요. 본명은 명호인데, 이걸 풀면 하늘빛이지요. 이분이 함평에서 차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지은 차를 들고 와서 저녁마다 다방을 열었습니다. 백일동안 연다고 해서 "백일다방"인데, 흔히 하는 회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떨때는 논쟁도 붙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을 믿고 힘을 주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실상사에서 같이 참여했던 서림스님은 자기의 수행방법으로 걷기를 선택했지요. "걷는 즐거움"이라는 글을 썼지요. 이 분이 완전히 투사로 변신했어요. 막판에 와서 이 분이 "이 걷기운동이 이래서는 안된다.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11월 13일 전국 농민대회까지 걷자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분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105일간의 걷기는 귀농을 준비하던 그에게 농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반에는 공식간담회같은 게 없었어요. 대구까지 가기 전에는 그냥 지역분들의 생각을 듣는 것 위주였지요.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더 이상 해 먹을 게 없고,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이고, 농민들 스스로는 자포자기의 심정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길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걷기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농민과의 간담회에서 다룬 주제는 이렇다.
"쌀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지역 연대기구를 만들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로 가니까 다들 할말과 할일이 생깁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아이들에게도 쌀개방과 자신의 생활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더라구요."
농민만의 힘으로는 수입개방 못막는다
94년 쌀개방 당시에 비해 농민은 크게 줄었다. 이제 400만 농민을 헤아린다면 인구의 10%. 김치환씨는 "농민만의 힘으로는 수입개방 못막는다"고 단언한다.
"농민들에게는 자포자기 심정이 많습니다. "농민만으로는 안된다"는 걸 확인해 온 거지요. 94년 농민이 천만이다고 할 때도 10년 유예밖에 못했는데, 지금 400만 농민으로 되겠냐는 겁니다.
결국 농민만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 노동, 시민단체가 나서줘야 되는 데, 여기서 핵심은 농민이 지켜온 식량주권과 환경안보에 대해 인정하는 겁니다. 농업이 가진 비경제적 가치가 20조라고 하는 데, 이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이 개방되었을 때의 충격을 우리 사회가 흡수 못해요. 답이 없단 말입니다. 농업이 바로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되요.
이제와서 농민에게 농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면 안됩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땅을 지켜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 때입니다."
김치환씨는 곧 농사를 지으러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보고 돌아온 그가 오히려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은 절대적 가칩니다. 다른 여러가지 중에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농민과 도시노동자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농촌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겁니다."
이정무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002-10-20]
 일년남짓 귀농(歸農)을 준비하던 그는 귀농학교에서 정경식 정농회 부회장으로부터 걷기운동 참여를 제안받는다. 마침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준비를 하던 그는 "귀농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 100일 걷기에 참여한다.
일년남짓 귀농(歸農)을 준비하던 그는 귀농학교에서 정경식 정농회 부회장으로부터 걷기운동 참여를 제안받는다. 마침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준비를 하던 그는 "귀농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 100일 걷기에 참여한다. 그와 걷기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7월1일 진도를 떠나 10월 13일 서울에 들어오기까지 105일 동안 1900여 KM를 걸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45회를 완주한 셈. 이봉주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합쳐 28번의 마라톤을 완주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대단한 거리이다.
그들은 왜 걸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그들이 걷기를 시작한 곳이 말해준다.
<고려시대 삼별초와 WTO시대의 걷기운동>
"여름은 국토순례의 계절이지요. 대학생들의 국토순례도 그렇고... 보통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장산성은 고려때 강화도에서 밀려난 삼별초의 항몽 전적지다.
"고려정부도 몽고에 투항을 했고, 몽고는 당시에 대제국이었고 결국 강화도에서 밀려나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13년간 대몽항쟁을 했던 삼별초와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삼별초가 "이긴다"는 믿음으로 싸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삼별초는 그 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WTO의 거대한 물결을 이겨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쌀개방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열다섯명이 걸었구요. 7월 1일에 진도에 가니까 실상사에서 오신 스님 두분하고, 대변인을 맡은 김재형씨하고 그 분 딸, 이렇게 19명이 시작을 했구요. 보성에서 열네살 한네, 남원에서 수연이, 8월 7일경에는 치유공동체의 아이들도 참여를 했구요. 시작하고 50일이 지나면서부터 세른명 넘게 유지가 됐어요. 어른 아이로 나누면 아이들이 절반, 남녀로 나누면 여성이 절반이 됩니다."
 김치환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번에 걸쳐 "걷기운동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끌어간 운동"이며, "걸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자는 김치환씨의 "농업회생"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김치환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번에 걸쳐 "걷기운동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끌어간 운동"이며, "걸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자는 김치환씨의 "농업회생"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 생활속에도 WTO가 있다
"걷기운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입니다. 우리 걷기에도 다섯살의 아이부터 여든살의 어르신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두다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또 걷기운동은 천천히 걷는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성찰이라는 단어자체에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운동에는 WTO라는 분명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WTO로 대표되는 "빠르고, 크게, 효율적으로"라는 흐름이 이미 나의 삶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걸 좀 돌아보자는 거지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냐고 했더니 두 사람을 지목한다.
"하늘빛이라는 분이 있어요. 본명은 명호인데, 이걸 풀면 하늘빛이지요. 이분이 함평에서 차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지은 차를 들고 와서 저녁마다 다방을 열었습니다. 백일동안 연다고 해서 "백일다방"인데, 흔히 하는 회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떨때는 논쟁도 붙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을 믿고 힘을 주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실상사에서 같이 참여했던 서림스님은 자기의 수행방법으로 걷기를 선택했지요. "걷는 즐거움"이라는 글을 썼지요. 이 분이 완전히 투사로 변신했어요. 막판에 와서 이 분이 "이 걷기운동이 이래서는 안된다.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11월 13일 전국 농민대회까지 걷자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분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105일간의 걷기는 귀농을 준비하던 그에게 농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반에는 공식간담회같은 게 없었어요. 대구까지 가기 전에는 그냥 지역분들의 생각을 듣는 것 위주였지요.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더 이상 해 먹을 게 없고,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이고, 농민들 스스로는 자포자기의 심정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길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걷기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농민과의 간담회에서 다룬 주제는 이렇다.
"쌀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지역 연대기구를 만들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로 가니까 다들 할말과 할일이 생깁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아이들에게도 쌀개방과 자신의 생활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더라구요."
농민만의 힘으로는 수입개방 못막는다
94년 쌀개방 당시에 비해 농민은 크게 줄었다. 이제 400만 농민을 헤아린다면 인구의 10%. 김치환씨는 "농민만의 힘으로는 수입개방 못막는다"고 단언한다.
"농민들에게는 자포자기 심정이 많습니다. "농민만으로는 안된다"는 걸 확인해 온 거지요. 94년 농민이 천만이다고 할 때도 10년 유예밖에 못했는데, 지금 400만 농민으로 되겠냐는 겁니다.
결국 농민만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 노동, 시민단체가 나서줘야 되는 데, 여기서 핵심은 농민이 지켜온 식량주권과 환경안보에 대해 인정하는 겁니다. 농업이 가진 비경제적 가치가 20조라고 하는 데, 이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이 개방되었을 때의 충격을 우리 사회가 흡수 못해요. 답이 없단 말입니다. 농업이 바로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되요.
이제와서 농민에게 농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면 안됩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땅을 지켜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 때입니다."
김치환씨는 곧 농사를 지으러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보고 돌아온 그가 오히려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은 절대적 가칩니다. 다른 여러가지 중에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농민과 도시노동자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농촌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겁니다."
이정무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002-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