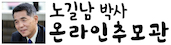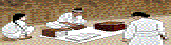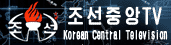서구 아닌 우리틀로 성경 읽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 작성일03-01-22 00:00 조회1,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구 아닌 우리틀로 성경 읽으면 그 정수를 더 잘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살리는 자비의 의 비는 허공을 채우고 있는데, 사람은 각자의 그릇따라 그만큼만 받아서 먹고 산다.”
"사람을 사람되게 살리는 자비의 의 비는 허공을 채우고 있는데, 사람은 각자의 그릇따라 그만큼만 받아서 먹고 산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봉원사쪽 연세대 뒷산 기슭. 한적한 집에서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신학자 소금 유동식(81) 박사가 의상대사의 화엄법계도를 읊조린다.
멋대로 자란 수염과 온화한 얼굴이 학자라기보다는 도인의 풍모다. 그의 서재 곳곳엔 평생 그가 그린 그림들이 널려 있다. 한 번도 훈련받은 적 없이 그가 마음대로 그린 것들이다. 그림 속엔 불국사와 법주사의 고졸한 맛이 깃들어 있고, 여성의 풍만한 나체도 있다. 종교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이며, 속박이기보다는 자유인 그의 영성세계가 엿보인다.
그는 최근 3년간 출소자들을 돕는 연희동 흰돌회 예배실에서 <금강경>으로 설교를 했고, 이달부터는 그가 예배 보는 연세대학교교회에서 네째주일 낮 12시30분마다 서구적 관점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성경을 보는 풍류신학으로 설교할 계획이다.
배타적 복음주의가 지배적인 한국 개신교의 터부를 깬 출발은 1963년 그가 발표한 기독교 토착화 논문이었다. 서구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이 논문으로 인해 최초의 토착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 한국의 종교들을 연구해 65년 베스트셀러인 <한국종교와 기독교>라는 책을 펴냈고, 한국인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종교적 영성을 규명하려고 무교를 연구했다.
그러나 그는 서당 훈장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엄격한 신앙생활에 따라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었던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독실한 신앙인이다. 지금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다.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던 부인 윤정은(75)씨도 2년 전 암 선고를 받았으나 신앙으로 이를 잘 극복해내고 있다. 그런 그가 왜 신학계의 태풍을 몰고 왔을까.
“해방 뒤 미국과 유럽에 유학을 해보고,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는 많이 알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암울한 식민지 백성이었다. 일본에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을 고비도 넘겼다.
해방이 되고 6·25때 피난간 전주에서 2년간 그는 ‘동서회통’의 삶을 보았다. 전주남문밖교회를 은퇴하고 당시 70대였던 고득순 목사였다. 고 목사는 동양고전을 통해 아주 쉽게 성경의 진수를 전하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틀로 본 성경 해석을 넘어서 우리의 틀로 성경의 정수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믿은 그는 유영모, 함석헌, 탄허 스님 등의 당대 선지식을 통해 동양을 재발견했다. 그는 또 유럽 유학 시절 신학계의 거목인 폴 틸리히, 볼트만, 칼바르트 교수 등을 통해 기독교를 보는 안목을 틔웠다.
연세대 신학과 교수로서 불교학생동아리를 창립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던 그는 풍류신학에서 예술신학으로 신학의 지평을 넓혀 최근 <종교와 예술의 뒤안길에서>와 <한국문화와 풍류신학>(한들출판사)를 펴냈다.
지금도 유 박사는 새벽 감사 기도로 하루를 연다. 그의 건강의 비밀이 드러나는 듯하다. 그가 “<도덕경>과 기독교 모두 자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죄가 없다고 가르친다”며 자족의 웃음을 짓는다.
글·사진 조연현 기자 |
[출처; 한겨레 2003-1-16]
 "사람을 사람되게 살리는 자비의 의 비는 허공을 채우고 있는데, 사람은 각자의 그릇따라 그만큼만 받아서 먹고 산다.”
"사람을 사람되게 살리는 자비의 의 비는 허공을 채우고 있는데, 사람은 각자의 그릇따라 그만큼만 받아서 먹고 산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봉원사쪽 연세대 뒷산 기슭. 한적한 집에서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신학자 소금 유동식(81) 박사가 의상대사의 화엄법계도를 읊조린다.
멋대로 자란 수염과 온화한 얼굴이 학자라기보다는 도인의 풍모다. 그의 서재 곳곳엔 평생 그가 그린 그림들이 널려 있다. 한 번도 훈련받은 적 없이 그가 마음대로 그린 것들이다. 그림 속엔 불국사와 법주사의 고졸한 맛이 깃들어 있고, 여성의 풍만한 나체도 있다. 종교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이며, 속박이기보다는 자유인 그의 영성세계가 엿보인다.
그는 최근 3년간 출소자들을 돕는 연희동 흰돌회 예배실에서 <금강경>으로 설교를 했고, 이달부터는 그가 예배 보는 연세대학교교회에서 네째주일 낮 12시30분마다 서구적 관점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성경을 보는 풍류신학으로 설교할 계획이다.
배타적 복음주의가 지배적인 한국 개신교의 터부를 깬 출발은 1963년 그가 발표한 기독교 토착화 논문이었다. 서구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이 논문으로 인해 최초의 토착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 한국의 종교들을 연구해 65년 베스트셀러인 <한국종교와 기독교>라는 책을 펴냈고, 한국인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종교적 영성을 규명하려고 무교를 연구했다.
그러나 그는 서당 훈장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엄격한 신앙생활에 따라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었던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독실한 신앙인이다. 지금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다.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던 부인 윤정은(75)씨도 2년 전 암 선고를 받았으나 신앙으로 이를 잘 극복해내고 있다. 그런 그가 왜 신학계의 태풍을 몰고 왔을까.
“해방 뒤 미국과 유럽에 유학을 해보고,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는 많이 알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암울한 식민지 백성이었다. 일본에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을 고비도 넘겼다.
해방이 되고 6·25때 피난간 전주에서 2년간 그는 ‘동서회통’의 삶을 보았다. 전주남문밖교회를 은퇴하고 당시 70대였던 고득순 목사였다. 고 목사는 동양고전을 통해 아주 쉽게 성경의 진수를 전하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틀로 본 성경 해석을 넘어서 우리의 틀로 성경의 정수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믿은 그는 유영모, 함석헌, 탄허 스님 등의 당대 선지식을 통해 동양을 재발견했다. 그는 또 유럽 유학 시절 신학계의 거목인 폴 틸리히, 볼트만, 칼바르트 교수 등을 통해 기독교를 보는 안목을 틔웠다.
연세대 신학과 교수로서 불교학생동아리를 창립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던 그는 풍류신학에서 예술신학으로 신학의 지평을 넓혀 최근 <종교와 예술의 뒤안길에서>와 <한국문화와 풍류신학>(한들출판사)를 펴냈다.
지금도 유 박사는 새벽 감사 기도로 하루를 연다. 그의 건강의 비밀이 드러나는 듯하다. 그가 “<도덕경>과 기독교 모두 자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죄가 없다고 가르친다”며 자족의 웃음을 짓는다.
글·사진 조연현 기자 |
[출처; 한겨레 2003-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